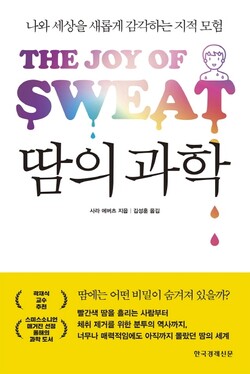"일부 진화생물학자들은 땀 흘리기 능력이 인간이 자연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말한다."
신간 <땀의 과학>에 나오는 이야기다. 더운 여름날 땀은 찝찝하고 불쾌한 느낌을 준다. 사실 알고보면 땀은 인간에게 무척 고마운 부산물이다. 그러나 자연계를 지배하는 무기로까지 격상시키는 건 과장이 아닐까. 이 책은 말한다.
"인류는 피부에 정교한 냉각장치를 장착한 덕분에 과열되지 않고 장거리 마라톤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사냥할 때는 먹잇감이 죽을 때까지 추적할 수 있었다. 우리의 저녁거리 사냥감이 단거리 달리기에서는 더 빠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달리면서도 체온을 낮게 유지할 수 있어 지구력이 탁월하다. 사냥감은 과열로 죽지 않으려면 조만간 멈춰 설 수밖에 없다." -본문 중
인간과 달리 땀구멍이 없는 개 같은 동물에겐 외부의 높은 기온이 거의 죽음이다. 책에 따르면 콘도르는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자신의 똥을 뒤집어쓴다고 한다.
책은 땀에 대한 거의 모든 이야기를 다룬다. 과학 수사, 의복 디자인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땀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냄새 매칭 데이트 행사 같은 땀과 관련한 이색적 이벤트, 땀의 노폐물 배출 효과와 스포츠 음료의 효능처럼 땀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상식, 땀을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적게 흘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사연 등이다.
이중 '빨간 땀'을 흘린 여성 이야기는 특히나 눈길을 끈다.
1996년 여름 남아프리카에선 한 20대 여성이 피부과를 찾아 특이한 증상을 호소했다. 땀이 빨간색이라는 것. 그런데 실은 이 여성에 앞서 초록, 파랑, 노란색 땀을 흘리는 케이스도 의학계에 보고되었다. 의료진은 부단한 추적끝에 그 여성의 빨간샥 땀의 비밀을 풀었다. 답은 그녀가 먹은 음식(간식)에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책에 나와있다.
이 책은 과학적 접근을 시작으로 역사와 문화와 산업을 넘나들며 독자를 ‘땀의 세계’로 안내하는 인문 교양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