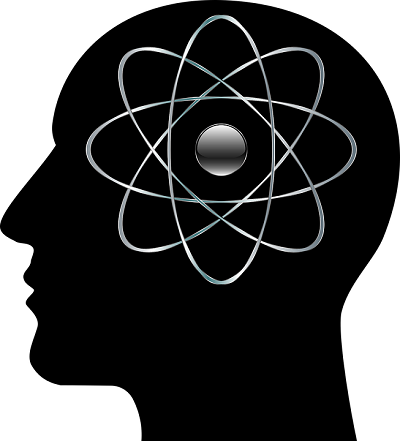
[더리포트]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종종 있다. 학창시절 교과서나 참고서에 나왔던 태양계 지도가 그중 하나다. 태양이 나오고 그 옆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천왕성, 명왕성이 줄지어 서 있는 그 지도 말이다.
지도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지구 표면을 일정한 비율로 줄여 약속된 기호로 나타낸 그림’이다. 그렇다면 태양계 지도는 태양계의 별들을 일정 비율로 줄인 도면이다. 그런데 실제 크기와 거리를 고려하면 ‘한 장’에 넣을 수 없다.
지구를 모래 알갱이에 비유하면 태양은 지구에서 6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오렌지만한 물체다. 만약 지구를 팥알 정도로 나타낸다면 목성은 300미터 떨어져 있어야 하고, 명왕성은 2.4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아는 무지개는 무지개가 아니다. ‘일곱 색 무지개’라는 고정관념 이야기다. 1668년 뉴턴은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킨 후, 무지개를 일곱 색깔로 규정했다. 이는 한 옥타브의 음정이 일곱이듯, 무지개도 그럴 것이라는 맹목에서 비롯된 비과학적 발상이다. 알다시피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아는 무지개는 무지개가 아니다. ‘일곱 색 무지개’라는 고정관념 이야기다. 1668년 뉴턴은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킨 후, 무지개를 일곱 색깔로 규정했다. 이는 한 옥타브의 음정이 일곱이듯, 무지개도 그럴 것이라는 맹목에서 비롯된 비과학적 발상이다. 알다시피 전혀 그렇지 않다.
빨강과 보라 사이에 무수한 색의 파장이 존재한다. 과학자들은 무지개의 파장 속에 숨어 있는 단색광을 무려 165가지나 구분해낸다. 이 165종 색상을 명도, 채도에 따라 세분하면 색의 숫자는 수십만 가지에 달한다.
얼굴도 얼굴이 아니다. 우리가 아는 얼굴은 형체가 있고, 눈 코 입이 있는 구체적인 실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사람 몸은 약 50개 조의 세포로 되어 있다. 따라서 얼굴도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이 세포는 또 다시 셀 수 없는 원자로 되어 있다. 원자 단위로 가면 머리가 아파오겠지만 조금 참고 읽어보자.
여기 점 하나가 있다. ‘있다.’ 뒤에 붙은 마침표를 말한다. 이 점은 깨알 보다 작은, 그야말로 미미한 점이다. 그러나 이 점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원자가 있다. 한 글자에 약 100만 개의 원자가 있으니 그 크기를 추측하기 바란다.
보통, 우리가 아는 최저 단위는 1밀리미터다. 그런데 원자는 1밀리미터의 1천만 분의 1크기다. 쉽게 말해 원자 한 개와 1밀리미터의 비율은 종이 한 장 두께와 63빌딩 높이와 비슷하다.
컴퓨터 화면이 수많은 픽셀로 되어 있듯, 우리 몸은 그보다 더 조밀한 원자로 되어 있다.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는 원자핵과 전자가 있는 나머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 원자를 테니스 공으로 상상해보자. 겉 표면이라는 건 없다. 그저 ‘구름’ 정도로 보면 된다.
또한 내부는 테니스 공 안쪽처럼 비어있다. 원자핵은 원자의 1/100000 정도로 아주 작다. 원자핵의 부피는 원자 부피의 1조분의 1이다. 원자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집이라면 전자는 먼지에 불과하다. 원자의 핵을 지구 중심에 놓여 있는 농구공으로 비유하자면, 전자는 지구 대기의 가장 바깥쪽을 도는 체리(cherry) 씨다. 농구공과 체리 씨 사이는 그저 텅 빈 공간이다. 즉 원자의 99.999%는 텅 비어 있다. 이를 통찰력 있는 한 문장으로 담으면 다음과 같다.
공간이 사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물이 공간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은 공즉지색(空卽是色) 색즉시공(色卽是空)을 떠올리게 한다. 놀랍지 않은가. 우리가 창문을 열고 풍경을 바라본다고 하자. 나무와 자동차, 건물과 같은 사물이 시야에 들어온다. 그런데 실은 텅 빈 공간이다. 이것은 마치 별이 빽빽하게 차 있는 하늘과 같다. 우리 눈에는 별이 촘촘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비어있다.
